난민들 마지막까지 머물던 700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땅이…정치적 이해관계 얽히며 강제 철거
英佛 백년전쟁 지도층 희생의 상징…최근엔 정글이라 불리던 난민들 거점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임)'로 상징되는 칼레. 역사적 상징이었던 칼레의 난민촌을 프랑스 정부는 무자비하게 철거했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1500명은 프랑스 전역의 난민 수용시설로 보내졌다. 철거 이후 방치됐던 이들은 기약 없는 난민수용소 체류 기간에 미래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의 칼레 난민촌 완전 철거 작전이 개시된 이후 마침내 이달 2일 칼레 난민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칼레 난민촌에 있는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1500명을 버스에 나눠 태워 프랑스 전역 난민 수용시설로 떠나보냈다.
프랑스 정부는 더는 칼레에서 영국행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영국행을 희망하는 이들의 바람을 묵살했다. 이들은 프랑스 전역으로 흩어졌고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난민에게 적대적인 지역으로 수용돼 신변 위협 등 불안감에 떨고 있다. 칼레가 지닌 역사적 명성과 중요성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칼레는 영국 도버까지 거리는 불과 3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칼레는 영국과 프랑스 간 쟁탈전이 치열했다. 14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이 시작된 지 10년째 되던 해에 영국은 칼레를 포위했다. 칼레 시민들은 1년 넘게 영국에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영국은 칼레 시민을 놓아주는 대신 귀족이나 부자 등 유지 여섯 명의 목숨을 요구했다. 이에 칼레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유스타슈 드 생 피에르가 먼저 목숨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뒤 여섯 명의 유지가 그를 따르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약속한 대로 칼레 시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 이들은 프랑스의 유명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 작품 '칼레의 시민들'로 현생에 부활해 지금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남아 있다.
역사적으로 '영예의 땅'이었던 칼레는 현재 '비극의 땅'으로 전락했다. 내전과 정정 불안으로 중동·아프리카에서 탈출한 난민은 칼레를 영국으로 넘어가는 최종 경유지로 삼았다. 난민은 칼레를 거쳐 영어를 구사하기 용이하고 일자리가 많은 영국을 종착지로 삼았다.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유로터널이 있어 선박보다 이동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칼레 난민은 2014~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000~3000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급증하면서 2015년 10월 6000명을 찍었다. 이후 꾸준히 늘어 1만명에 육박했고 지난달 철거 당시에는 8000여 명에 달했다.
칼레는 지난해 7월 난민 2000여 명이 한꺼번에 유로터널에 납입해 200여 명이 체포되는 등 아수라장이 된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집중 조명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난민촌 철거를 천명하고, 영국은 자국 내로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프랑스와 국경 보안 협약을 체결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난민촌 철거 요구가 격화됐다. 지난 9월 트럭 운전사와 부두 노동자, 농민과 상인은 트럭과 트랙터 등으로 칼레 주변 고속도로를 막고 난민촌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트럭 운전사들은 난민이 유로터널에 몰래 숨어들기 위해 자신들의 트럭에 올라타는 데 불만을 표출했으며 상인들은 난민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에 프랑스가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강경 일변도의 난민 정책이 강화하고 있다. 파리 테러 등으로 프랑스 국민 사이에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난민촌 폐쇄를 강조하며 민심 끌어안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난민촌 철거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장원주 기자 / 임영신 기자 / 김하경 기자]
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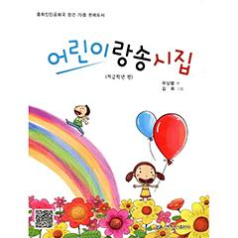 어린이 랑송시집(저급학년)--儿童朗诵诗集(低年级)
어린이 랑송시집(저급학년)--儿童朗诵诗集(低年级) 假面舞--탈춤
假面舞--탈춤 구술 연변 65년 경제편--口述延边65年 经济篇
구술 연변 65년 경제편--口述延边65年 经济篇 해방전중국조선족 소설문학의 파노라마 --解放前中国朝鲜族小说
해방전중국조선족 소설문학의 파노라마 --解放前中国朝鲜族小说 기분 좋은 실내화초 가꾸기 상--家庭养花一本通.上
기분 좋은 실내화초 가꾸기 상--家庭养花一本通.上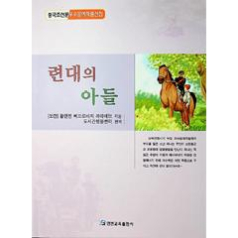 련대의 아들--团的儿子(朝鲜文)
련대의 아들--团的儿子(朝鲜文)